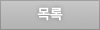이현: 색과 생명의 회화 -이규현 이앤아트(enart.kr) 대표, 전 조선일보 기자 함께 앉아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예술가이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현이 딱 그런 사람이다. 예술이 탁한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믿고, 예술을 위해 죽어도 좋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그림인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현이 아마 그 사람일 것이다.
이현의 그림 역시 이 사람과 비슷하다. 현실에서 분명히 흔히 볼 수 있을 듯 한데 누구의 눈에나 보이지는 않는 풍경이 그녀의 그림 속에 맑게 자리잡고 있다. 아마 그림과 그 그림을 그린 작가를 짝짓기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현과 이현의 그림을 짝짓기 하기는 쉬울 것이다. 이현은 27세에 로마로 유학 가 국립로마미술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이후 30년째 로마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탈리아 미술계의 주류무대에 올라선, 보기 드문 한국인 화가다.
그녀는 붓에 유화 물감을 묻혀 캔버스위에 그리는, 아주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회화를 하는 ‘용감한 화가’다. 너무 당연하고 기초적인 방법이라 잘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게 요즘의 회화인데, 이현은 이 전통적인 유화를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거기에만 매달려왔다. 게다가 선과 면은 단순 명쾌하고, 색은 절제된 몇가지만 쓰기 때문에, 그녀의 그림이 주는 첫 인상은 단순하고 순수하다.
이번 개인전에 나오는 60여점의 작품은 이현이 중시하는 ‘회화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먼 발치에서 보면 화면엔 색만 가득하다. 밤하늘의 검푸름이나 양떼의 하양 같은 강렬한 색이 캔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발짝씩 다가갈 수록 그 ‘색천지’ 속에 생명의 흔적이 보인다. 땅 위로 쏟아질 듯 넓고 검고 푸른 밤하늘 아래에 천천히 걸음을 떼는 사람의 모습엔, ‘아!’ 하고 그만 탄식이 나온다. 달과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는 고요한 밤바다 속에는 어딘가에서 작은 물바람이 일 것 같은 생명의 느낌이 있다. 많이 봤을 것 같은 꽃그림인데도 이현이 눈을 가까이 들이대고 그린 꽃은 ‘살아있음’을 과시하는 팔딱거림이 있다.
이현은 자신이 그리는 모든 것은 “나중에 세상과 헤어지고 나면 그리울 풍경”이라고 말한다. 어찌 보면 살아 있는 동안 우리는 거들떠보지 않고 지나치는 흔한 풍경인데, 이현은 그런 자연에 다가가 “네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기억할거야”라고 말해주는 듯 하다.
이현의 그림에서 기법적인 면으로 도드라지는 것은 색의 대비(contrast)다. 새하얀 양떼와 새파란 풀밭, 캔버스의 절반을 덮은 빨간 꽃잎과 나머지 절반을 덮은 초록색 꽃줄기... 어쩌면 그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밤하늘도, 밤바다도, 꽃도, 양떼도 아니고 그냥 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색도 원초적인 빨강, 파랑, 노랑, 초록, 하양, 검정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는다. 그녀의 회화에서 가장 가장 뛰어난 점은 이렇게 기본적인 색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색의 대비만으로 충분한 ‘회화의 유희’를 이끌어낸다는 점이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녀를 가리켜 ‘빛과 색채의 화가’라 하기도 한다. “흰색과 초록색의 대비를 보면 가슴이 뛰고 설렌다”는 그녀에게 사실 구체적 형상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현의 그림이 구체적인 형상에 바탕을 두고 있을 지언정 기본적으로는 추상화라고 생각한다. 현대미술은 100년째 갖가지 새로운 양식으로 실험 중이다. 미술이 시각예술이라기 보다는 관념예술이라 해도 좋을 단계도 이미 겪었다. 그런데 이현은 ‘관념을 바탕으로 하는 유희’에는 손을 들어 경계한다.
어려서부터 문학과 음악에 파묻혀 살았던 이현 역시 관념의 벽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다. 어려서 유달리 몸이 약했던 이현은 밖에 나가서 놀기가 어려웠기에 집에서 책과 음악, 미술에만 빠졌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그녀의 작업실은 지금도 문학, 철학, 음악으로 꽉 차 있다. 그녀는 늘 시를 읽고 종일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 첼로와 드럼과 피아노를 연주하기도 한다. 이렇게 많은 사색과 관념으로 무장을 했지만, “관념의 벽을 높게 쌓은 뒤 그것을 다 부수니까 단순한 작업이 나오게 됐다”고 그녀는 말한다. 그래서 속이 복잡한 화가 이현의 그림은 희한하게도 단순명쾌하다. 어려서부터 마음 속에 두려움과 어두움을 갖고 살았기에 누구보다도 밝고 환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의 예술은 역설적이다. 이현은 “현실과 똑같이 그리는 것은 사진이고, 관념을 표현하는 것은 철학이다. 나는 그냥 미술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현은 ‘그냥’ 미술을 한다. 붓에 유화 물감을 묻혀 캔버스에 그리는 회화의 처음 모습으로서의 미술말이다. 누구나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리워할 풍경을 보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살아 있는 순간을 감사하고, 그 순간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거기에 그림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현은 조용하고 외롭다. 오직 그림이라는 ‘창문’을 통해 사람들과 이야기 하고 싶어한다. 그런 화가 이현이 내주는 그림이라는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치열하고 복잡한 삶에서 한걸음 비켜 서서 마음을 쉴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