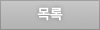푸른 고요가 빚어내는 정령들 - 서영은/ 소설가
눈 덮인 벌판에 마른 풀 몇포기가 바람에 떨고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이 현의 그림 세계가 아니다.
저 멀리 하늘과 바다가 포개어져 있듯이, 눈 덮인 벌판은 바다롸 포개어져 있음으로서, 그 몇 포기의 풀들은 세계에 충만한 아득히 고요로부터 피어오르는 희디 흰 눈의 정령으로 변한다. 그리고 그것에 감응하듯 돌연 수평선에는 빛의 묶음이 솟아로른다. 세계에 충만한 고요가 너무도 깊고 깊은 나머기 하늘도 바다도 숨을 죽여 온지 얼마나 됐을까.
여기서 시간은 흘러서 소멸한다기보다 쌓이고 쌓여서 고요의 깊이가 된다.
자정. 고요는 그 속에서 하늘과 바다와 땅이 숨쉬는, 너무 투명해서 싸아하고 매운 대기(大氣)이다.
나무들은 고요에 앞서 거기 있었다기보다, 고요의 뒤를 따라서 천천히 자라나고 있다. 나무들은 하늘을 그리워하는 지심(地心)의 영매(靈媒)들이다. 그래서 그 자태는 딱딱한 각질의 수피(樹皮)를 벗어 던지고, 공기처럼 가벼운 수직의 기체로 변하고 있다. 바다는 이미 정령으로 변한 만물의 물의 화신(化神). 그 깊고 푸른 물은 하늘이 띄운 빛의 배를 맞으려 수평선을 높이 들어올리고, 달은 휘어져 물을 향해 어여뿐 무릎을 끊고 있다. 세계가 소리 없이 사랑을 실현하고 있는 설화의 시간.... 정오. 눈부신 빛으로 변한 고요. 빛의 뿌리로부터 피어난 노오란 수선화는 창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낸다.
창가에 놓여 있는 테이블. 그 앞에 앉아 있던 사람은, 그의 마음속 환한 고요, 평화로움을 테이블 위에 내려 놓고 방금 자리를 떠난듯 하다.
그가 떠나간 방향은 세상의 소란 쪽이 아니라, 당연히, 세상의 잡다한 소란이 한 순간에 잠잠해 지는 곳, 빛의 화산 그 한복판이다. 그의 육신을 삼킨 고요는 한층 더 밝아진 눈부신 광채를 세상에 뿌리고 있다. 테이블 위에 고즈넉이 놓여있는 붉은 잔은 그가 세상 속에 남겨 놓은 마지막 흔적. 광채가 잠자리떼 처럼 공중을 뒤덮고 있다. 해질녁. 빛이 스스로 몸을 사르어 어둠으로 바뀌는 때. 눈은 마치 그때를 알리러 온 전령처럼 세상을 하얗게 뒤덮고 있다.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바로 그때만, 잠시 동안 하늘이 가슴을 헤쳐 보여주는 자신의 붉은 심장. 그 심장으로부터 검은 피가 줄기줄기 지상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처연한 고요. 다시 자정. 화가의 매운 붓은 걷고 또 걷는다.
벽 하나 너머로 밤거리를 질주하는 차량들의 소음을 지나, 쌓이는 청구서, 세속적 기쁨과 슬픔을 지나, 관계의 속절 없음을 지나, 덧없는 희망과 절망을 지나, 세계의 끝, 존재의 끝에 도달한다.
비로소 화가의 붓은 캔버스를 검게 검게 물들인다. 섬의 형태이나, 그것은 화가 자신의 영혼의 피다.
섬은 화가를 밤새도록 응시하고 있다. 정령들의 아름다운 희유(嬉遊). 새벽이 밝아 온다. - 서 영은(소설가) 1997.
|